
투인원 태블릿을 만들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투인원 노트북을 만들었다. MS는 이 제품에 ‘서피스북'(Surface book)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서피스북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기립 박수를 치던 현장의 외신 기자들과 같은 마음이었다. 멋진 공연을 펼친 무대의 주인공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던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서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서피스북에 보낸 환호는 PC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편견을 깰 수 있는 메시지를 서피스북이 보여준 때문일 게다. 정말 개성이 부족하고 메시지가 없는 오늘 날의 PC를 보며 답답했던 마음을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서피스북에서 엿봤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예약 판매를 시작한 서피스북이 일찍 품절되고 초기 매장 구매조차 쉽지 않은 현상은 이용자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노트북 중에 이러한 현상을 보인 제품은 없었다.
대체 PC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PC 제조사가 만든 제품도 아닌 노트북에 이리도 환호를 보낸 것일까? 수많은 이유 가운데 이 장면을 이해하기 좋은 이유라면 PC시장의 내제된 불만에 대한 반향일 것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노트북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도 소비자가 살만한 노트북이 없다는 현실도 크게 거들었다. 오죽하면 냉정한 이용자들은 그동안 살만한 노트북으로 애플 맥북 시리즈를 골랐다. 전통적인 윈도 OS를 쓰는 노트북 대신 맥북을 사고 필요에 따라 윈도를 함께 쓰기도 했다. 한입 깨문 은은한 사과 로고와 깨끗한 만듦새의 맥북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용자의 정체성과 연결됐다. 그러니 모든 노트북 리뷰에서 ‘맥북과 비교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심지어 서피스북 마저도 비교 대상은 맥북이었다.

물론 PC 업체들이 새 노트북을 내놓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들도 노트북 수요가 많은 새학기 시작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노트북을 선보인다. 또한 인텔도 해마다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고 좋은 성능을 가진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내놓고 새로운 폼팩터를 제안하며 활력을 불어 넣으려 애썼다. 그러나 새로운 부품으로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PC기업들은 팔리는 노트북만 내놓으려 할 뿐 디자인 센터를 갖고 있는 레노버를 비롯한 극히 일부 업체를 빼고 노트북의 진화를 고민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노트북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운 제품 하나 나오지 않은 것이다.
PC 업체들이 노트북에 투자를 꺼리게 된 것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한 탓이다. PC 업체들은 1차 목표는 제조 단가를 낮추는 것. PC는 포화 시장으로 진입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보다 먼저 사는 제품이 아니라는 현실이 PC 제조사를 덮치자 돈을 덜 쓰는 생존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비싼 PC는 안팔린다’는 말은 어느 순간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고 값싼 제품이 시장에 넘쳤다. PC 업체들의 선택은 단순했다. 값싼 제품에 브랜드를 붙여 이익을 남기기로 한 것이다. 중국에서 만든 ODM 제품을 가져다 브랜드만 붙여서 팔던 것도 부지기수였고, 이런 방법으로 PC 업체들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런 제품이 시장에 쏟아질 수록 살만한 노트북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생산자가 같고 포장만 조금 바꾼 엇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넘치니 노트북의 매력은 점점 떨어지기만 했다.
PC 업체들이 노트북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때, 서피스북은 이용자에게 충분한 자극을 준다. 이용자들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기능과 성능을 담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제조사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서피스북에서 설득력을 얻은 데는 단순히 껍데기만 바꾼 게 아니라 기구 자체를 설계하면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아주 정성들여 설명했다. 지난 몇년 동안 PC 업체들이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리고 모든 발표가 끝났을 때 서피스북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노트북이 된다. ‘부르고 싶은 이름을 가진 고성능 투인원 노트북’. 정체성 없는 노트북에 대한 역설이다.

혹자는 서피스북의 유일한 단점으로 가격이라고 말한다. 모든 구성은 다 좋은데 비슷한 구성의 노트북과 비교할 때 비싸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나는 가격을 단점이라 말한 그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피스북을 지금 쓰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은 결국 가치의 문제라서다. 물론 서피스북이 다른 노트북보다 비싼 것은 맞다. 다만 그 돈을 주고도 사고 싶을 만큼 가치를 가진 다른 PC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이 많이 들면 안 사면 그만이나 결국 사고 싶으면 지갑은 열린다. 비싼 노트북은 안 산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한 역설인 셈이다.
서피스북을 비롯한 서피스 제품군이 좋은 반응을 얻다 보니 이제 MS가 PC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는 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들이 한결 같이 고개를 가로 저으며 분명히 선을 긋는다. 자기들은 윈도 10의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뿐, 그것으로 PC 업계에서 경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제품이 기준이라면 그 어떤 업체가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을지 지금은 감을 잡기 힘들다. 레노버? HP? 델?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PC 업체들에게 서피스북은 그 자체로 ‘PC는 재미 없고, PC는 비싸다, PC는 정체성이 없다’는 업계의 상식을 뒤집은 역설로 다가와 있는 게 아닐까?
# 덧붙임
스킨 오류로 이 곳에 공개된 모든 글의 작성일이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15년 11월 18일에 공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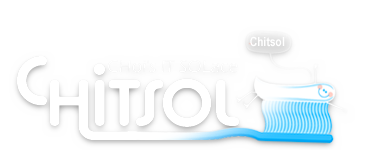
B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