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성 시대를 맞이한 넷북의 흥행은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2007년 7인치 화면을 쓴 에이수스의 eeePC라는 초소형 노트북의 등장 이후 이에 따른 폭발적 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차츰 형성되던 시장은 인텔이 아톰 프로세서 발표와 함께 정의한 넷북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해 2010년까지 매년 수천만 대씩 팔리던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다. 이 시기 넷북 시장에 집중한 에이서가 매우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PC 시장 2~3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 했던가. 너무 짧은 전성기를 탓할 새도 없이 넷북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넷북의 주요 생산자였던 델, 에이수스는 지난 해, 에이서는 올해 넷북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제 HP와 인텔, 레노버를 비롯한 극소수의 제조업체만이 저개발 국가를 위한 교육용 PC 수요를 채우는 수준의 넷북을 생산하는 정도여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넷북은 보기 힘든 제품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에만 1억4천만 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커다란 흐름으로 점쳐진 넷북은 거짓말처럼 이제는 정말 어렵게 찾아야 하는 그런 제품이 되고 말았다.
넷북의 급격한 쇠퇴를 불러 온 원인은 복합적이다. 넷북 시장을 형성했던 10인치 화면 크기의 모빌리티 경쟁에서 비슷한 태블릿에 밀렸고, 이용자가 요구한 사용성을 뒷받침할 만한 성능의 발전을 방해했으며, 고성능 제품의 출시로 이 시장에 대한 자기 잠식이 이뤄지면서 넷북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약해진 넷북의 존재 가치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넷북이 PC 시장에 미친 영향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컴퓨팅
7인치에서 출발한 넷북은 10인치대에서 대중적인 시장을 형성했는데, 이는 화면과 키보드를 결합한 노트북의 특성 중 휴대성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최소의 사용성을 확보한 크기였기 때문이다. 화면이 작고 전체적인 본체의 크기가 작아진 덕분에 무게는 고작 1~1.3kg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배터리도 5시간 정도는 충분히 버텼다. 어지간한 가방에 가볍게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이전의 노트북에선 쉽게 경험하기 힘든 제품이었다.

노트북도 들고 다니며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만, 넷북 이전까지 그 휴대성을 강화한 보편성을 지닌 PC 제품군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크고 무거운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하면 넷북은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제품이다. 화면과 키보드를 모두 갖춘 노트북 형태였고 여기에 PC의 사용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노트북보다 더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던 것이다.
작은 본체, 가벼운 무게는 PC를 쓰는 장소를 바꿔 버렸다. 사무실이나 책상 같은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커피 테이블과 무릎, 침대까지도 PC를 쓸 수 있는 장소로 바꾼 것이다. 그 이전에 노트북도 가능했지만, 이보다 쉽진 않았다. 결과적으로 넷북을 들고 다닌 이용자에게 모빌리티 컴퓨팅의 경험을 전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셈. 하지만 이것은 더 강화된 모빌리티 컴퓨팅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한 넷북의 쇠퇴와 울트라씬, 울트라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PC 제품군의 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낮아진 가격 저항선

무엇보다 넷북이 대중성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작고 가벼운 때문이 아니라 기능 대비 구매하기 쉬운 가격 모델을 갖고 있어서였다. 노트북이 갖고 있던 높은 가격 장벽을 깬데다 시간이 지날 수록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아진 터라 노트북 구매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낸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넷북의 등장에 맞춰 PC 교체 수요가 몰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값 싼 넷북에 대해 매우 큰 매력을 느끼고 대량 구매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던 것도 이러한 가격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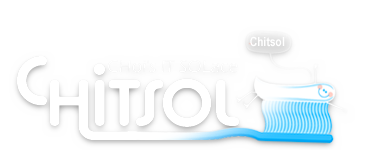
정말 ‘넷북’을 찾기 어려워졌네요.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는 넷북 뭐가 좋냐고 막 물어보는 친구들의 등쌀에 고생했었는데… 그것도 이젠 기억 속으로…
네.. 기억 속에 묻어야 겠지만 역사로 계속 남게 되지 않을까요? ^^
넷북의 자리를 이제 저가형 울트라북(?)이 채워가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과거에는 12인치만 해도 보기 힘들었고 14인치 급이 작은 편이었고
작은 사이즈는 너무 비쌌는데, 10~12 인치 급을 접하기 쉬워지게 한 공로가 있는것 같아요.
10인치 미만은 태블릿으로, 그 이상은 울트라북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