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WC를 하루 만에 다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제품을 모두 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첫째날은 전시장을 두루 돌아다니며 각 부스에 전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면서 분위기를 익히게 되는 데 올해 분위기는 예년과 또 다르다. 새로운 전시장에서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화제로 떠 올릴 만한 제품이 부족한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서다.
이곳에 전시되는 제품을 평가 절하하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단말기는 최종 소비자가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올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비슷한 제품의 경쟁이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도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제품군이 경쟁을 펼친 지난 해와 다르게 올해는 딱히 경쟁이라고 볼 것도 없다. MWC에 앞서 제품들은 모두 공개되었다고는 하나 이 제품들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벌어져야 할 경쟁이 약해 분위기는 차분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꼽을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단말기의 핵심 처리 장치 경쟁이 없다. 지난 해에는 새로운 모바일 AP의 경쟁을 통해 하드웨어 성능 경쟁이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 이번 MWC는 새로운 모바일 AP를 채택한 하드웨어간 경쟁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옵티머스G 프로, HTC 원처럼 퀄컴 차세대 AP를 적용한 제품들은 나왔지만, 같은 계열의 경쟁은 MWC 이전에 이미 소비자가 체감한 터라 관심도가 높지 않다.

셋 째, 이곳의 관심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차세대 모바일 OS에 쏠리면서 하드웨어 제조사들도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다. 지금 이곳은 파이어폭스와 타이젠, 우분투 리눅스 등 모바일 OS가 관심의 대상이다. 새로우 모바일 OS의 출현을 목말라 하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바람이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이번 MWC의 분위기로 봐선 안드로이드의 세를 넓히려는 의지는 어느 정도 실종된 느낌이다. 구글의 참석 여부와 관련 없이 이미 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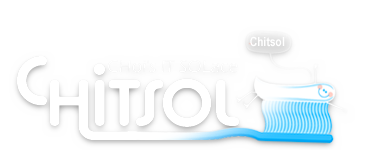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시대 같은 느낌이죠.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우르르 나오는. 하지만 눈에 띄는 상대는 없는 그런 약간은 정체기요.
그리고 x86의 발달을 답습해온 ARM/안드로이드 라서
발전 속도가 너무 빨랐던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긴 했지만, 여전히 속도와 배터리를 다잡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