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직히 말하면 나는 스피커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니며, 이를 소유하고픈 로망도, 동경도, 열망도 크지 않다. 단지 몸을 때리는 시원한 소리나 그동안 몰랐던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를 만날 때 이따금씩 놀랄 뿐이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면 몰라도 소리를 음식의 맛에 맛깔나게 비교하는 그런 능력은 전혀 기르지 않았다. 그런 얕은 지식 탓에 지난 1월 23일의 뱅앤올룹슨(Bang&Olufsen)의 베오플레이 A9 발표회는 내게 상당히 어리둥절한 자리였더랬다.
내게 뱅앤올룹슨이란 편견 같은 커다란 이미지가 하나 있다. 그것은 ‘비싸다’이다. 물론 비싼 이유가 있는 것을 모르진 않는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처럼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드는 하나의 이유 정도면 될까?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은 갖고 싶은 동경과 로망을 자극하고 그런 부류에 B&O도 속해 있는 브랜드로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무엇보다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던 가수 박정현 효과로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으로 구입한 뱅앤올룹슨 A8 이어폰이나 가끔 듣는 지식의 깊이로는 뱅앤올룹슨을 찰지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재료를 손질할 줄 모르니까, 맛깔나게 요리할 자신이 없는 것은 당연하기에 뱅앤올룹슨의 베오플레이 A9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겐 무리다. 단지 지난 발표회에서 처음 실물을 접했던 베오플레이 A9의 흥미로운 자태에 대해선 몇 마디 남기고 싶기는 하다.
발표 공간에 놓여 있던 베오플레이 A9을 봤을 땐 그것이 스피커가 아닌 줄로만 알았다. 물론 거실에 대충 얹어 놓은 야마하 사운드바 덕분에 일찍이 스피커가 여러 개로 나뉘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깼지만, 그냥 둥근 것도 아닌 볼록 렌즈처럼 생긴 돔 레이더 같은 만듦새는 여전히 깨지 못한 고정 관념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던 것이니까. 그것도 원목을 깎아 만든 발 세 개짜리 스탠드에 지탱하고 있을 줄이야… 어쨌거나 베오플레이 A9이라는 녀석을 가까이서 볼 때는 꽤 단단했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원목 의자에 등을 살짝 기대고 누워 참 느긋하게 손님을 맞이한다.

둥근 돔에는 3/4인치 트위터 두 개와 3인치 미드레인지 스피커 두 개, 8인치 우퍼 등 고중저의 음역을 모두 아우르는 스피커가 들어 있다. 그것을 6가지 색상의 패브릭 커버 중 하나로 가려 놓은 터라 보이진 않는다. 이 스피커의 소리는 때론 경쾌하게도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용하면서도 힘이 넘치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480와트의 힘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A9의 뒤판 위쪽, 오톨도톨한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윽 문질렀을 뿐인데 어느새 최대 음량까지 목청을 돋우며 감당키 어려운 소리로 윽박지른다. 아래층, 위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실컷 소리를 내질러도 좋은 곳에서 베오플레이 A9을 만났음에도, 역시 이런 스피커를 대할 땐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인지 깨우친 것이 그나마 다행이려나 싶다.

아, 베오플레이 A8도 그랬지만, A9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리모컨 겸 플레이어로 써야 한다. 아니면 B&O 스타일의 50만 원짜리 리모컨을 쓰는 방법도 있다. -.ㅡㅋ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DLNA를 이용하거나 애플 에어플레이를 이용하는 두 방식을 써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둘다 무선 랜을 이용하지만 어느 쪽에서 소스를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악도 서로 다르게 들리는 게 아닐까 싶다. 실제 에어플레이의 소리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소스 데이터를 불러와 A9에서 재생하는 DLNA 방식보다는 소스를 미리 해석해서 내보내는 에어플레이쪽 품질이 더 낫다는 말일 게다. 어찌됐든 이 방식을 이용하면 구차하게 선을 연결하지 않고 쇼파에 등을 깊이 파묻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음악을 무선으로 폼나게 들을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에어플레이든 DLNA든 연결하는 법을 알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얼마냐고? 339만 원. 물론 에누리란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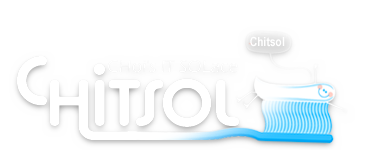
가격 먼저보고 물건을 봐야합죠… 암요… ㅠ_ㅠㅂ
사실 이 제품은 가격도 보면 안 됩니다. 브랜드부터 봐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