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딴지 벌써 15년이 흘렀는가보다. 지갑 속에서 주민증 대신으로나마 그 존재감이 있었던 이른바 ‘장농 면허증’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건 2000년에 97년식 뷰롱이(티뷰론) 중고를 내 생애 첫 차로 입양했을 때부터다. ‘나이와 자동차 CC는 같아야 한다’는 비공인된 사회적 상식과는 반대로 지금은 좀더 작은 소형차로 바꿨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세단으로 인정받은 티뷰론은 튜닝하며 길들이는 맛도 좋았고 달리는 재미도 쏠쏠한 놈이었다.
그 뷰롱이를 타던 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대한민국 경찰청 마크가 붙은 연노란색 우편물을 자주 받았다는 것. 여러 분들이 짐작한 그대로 ‘과속딱지’였다. 차를 바꾸기 전까지 1년에 많게는 서너번은 받았던 듯 싶다. 좀 심한 건 80km 제한 구간에서 시속 60km 초과였을 것이다. 그래도 의외로 잘 달려준 뷰롱이의 속도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고, 정말 운전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던 때라 과속에 걸려 기분은 좀 상했어도 그리 기분 나쁘게만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두어번 과태료를 내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싶더라. 뒤늦게 생돈이 날아간 것이 씁쓸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으이그 둔한 것!- 벌점을 감하려고 일부러 만원을 더 내는 과태료를 낸 것인데, 낮은 월급을 받던 그 때 7만원이 큰 돈이라는 걸 조금 늦게 알았다. 7만원… 모빌원 0W-40을 넣고도 2만원은 남길 수 있는 돈이 아니던가…
딱지 값을 내고 난 뒤에도 제한 속도를 넘겼다는 죄의식은 눈꼽만큼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저 ‘재수 없었어’라거나 ‘사회가 날 미워해’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 바빴다. 쥐꼬리 만큼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들이 갖는 피해 의식 속에서 피어난 모종의 반발이지만, 내게 득되는 게 없던 것에 대한 자기 위안을 그런 식으로나마 찾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덜 성숙한 양심의 문제겠지만, 이상하리만치 그 뒤로도 그 양심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반발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속도를 지키라는 특정 집단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벌부터 받으라는 식이 싫었던 것이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라는 명분은 있지만, 과속의 기준이란 게 안전을 위한 속도인지 단속을 위한 속도인지 애매한 것이 현실이니까 말이다. 과속 기준의 근거를 아는 이들은 얼마나 될 것이며, 왜 자동차의 계기판은 240km까지 만들어 두었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만드는 자동차 업체에는 발전한 기술력을 칭찬하고 온갖 경외의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운전자가 조금만 속도를 올렸을 때 곧바로 범법자로 취급하는 현실이 얼마나 우스운가 말이다. 시속 300km가 넘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는 면죄부를, 일시적 충동으로 약간의 과속을 한 운전자는 곧바로 범법자로 낙인찍는 것은 모순이 아니던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런 현실은 운전자로 인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피해가는 것 뿐. 지킬 것은 지키고, 그 다음은 내 소신에 따라 달리는 것이다. 그것이 이 사회와 타협점을 찾은 나의 결론이자, 내가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띵동 띵동’. 과속 구간을 앞에 두고 요란안 소리를 내면서 시뻘건 화면을 번갈아 비추는 내비게이션의 경보는 사회와의 타협점을 잊지 말라는 알림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피해에 대해 이 사회를 경계하라는 경고일까? 운전하는 동안 내 생각은 뒤쪽 질문에 머물러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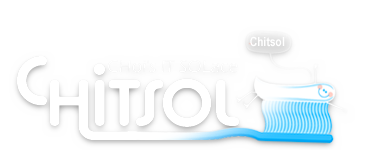
저도 과속으로 딱지 많이 끊었는데^^;
결혼 후 ‘아이가 타고 있어요’를 붙인 다음부터는 안전운전을 하게 되더라구요. 하하;
ㅎㅎ ‘초보 운전’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니겠습니까? ^^; 저는 언제나 붙여볼런지..-.ㅡ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