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모바일 가상 현실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 쓸만한 모바일 앱의 등장을 기대했던 스마트폰의 초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관련 컨텐츠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전했다. 아마 분야를 세세히 나눠보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먼저 흥행하게 될 분야의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일 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많은 이들이 먼저 접하게 될 컨텐츠는 성인물을 제외하면 보나마나 또 게임일 것이다. 어려운 장치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데 게임만한 것이 없으니까.

지스타에 있던 모든 가상 현실 게임이 이처럼 완성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사실 지스타에는 몇몇 대학생들의 가상 현실 게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앞서 나온 상용 제품에 비하면 완성도는 미흡하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만든 것이지만, 졸업 작품의 의미를 담은 게임도 있고 나름의 개발 스토리를 가진 게임들도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지난 해에는 1개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발품 좀 팔았더니 5개나 볼 수 있던 게 소득이라면 소득일 지도 모른다. 이 중에 산학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눈앞에 둔 것도 하나 있는 것다는 걸 확인한 건 다행이고.
 상용화를 염두에 둔 제품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생들의 졸업 작품들은 느낌이 엇비슷하다. 대부분이 로봇의 조종석에 앉아서 즐기는 게임이다. 물론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 완성도는 다르긴 하다. 그래픽이나 프로그래밍의 차이도 느껴지고 게임을 즐길 때의 재미나 3D의 입체감의 수준도 모두 천양지차다. 대체로 6개월~1년 사이에 만든 게임이지만 기획과 그래픽 담당만 둔 채 프로그래머 없이 게임을 만든 팀도 있다. 공개된 코드를 조합했다고 하나 노력이 없다면 이만한 결과도 내지는 못했을 터. 국내 VR 관련 교육의 현실은 딱 거기까지로 보인다.
상용화를 염두에 둔 제품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생들의 졸업 작품들은 느낌이 엇비슷하다. 대부분이 로봇의 조종석에 앉아서 즐기는 게임이다. 물론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 완성도는 다르긴 하다. 그래픽이나 프로그래밍의 차이도 느껴지고 게임을 즐길 때의 재미나 3D의 입체감의 수준도 모두 천양지차다. 대체로 6개월~1년 사이에 만든 게임이지만 기획과 그래픽 담당만 둔 채 프로그래머 없이 게임을 만든 팀도 있다. 공개된 코드를 조합했다고 하나 노력이 없다면 이만한 결과도 내지는 못했을 터. 국내 VR 관련 교육의 현실은 딱 거기까지로 보인다.
반면 국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스타에 부스를 마련한 외국 대학교의 게임 데모도 인상적이다. 아직 게임의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는데, 처음부터 상업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그런지 다른 게임보다 완성도는 높다. 지스타에는 6개월 정도 작업한 FPS 게임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현업에서 활동하던 개발자들이 교수로 재직 중이라 불필요한 코드를 쓰지 않는 게 특징이란다. 물론 프로토타입 수준이라 실제 상업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전문 커리큘럼의 도입이 얼마나 차이를 보여주는 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지스타 곳곳을 돌아다녀야만 이 같은 가상 현실 장치와 게임을 볼 수 있긴 했어도 이처럼 많은 가상 현실 컨텐츠를 본 것은 외국 전시회가 아닌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던 듯하다. 물론 지스타에 있던 모든 가상 현실 게임을 더해도 이곳에 나와 있는 대규모 게임들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단순 제작이든 상업화든 도전적 실험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덧붙임 #
이 글은 에코노베이션에 기고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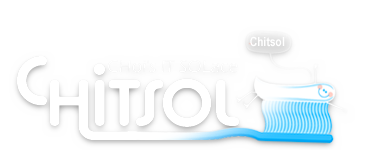
Be First to Comment